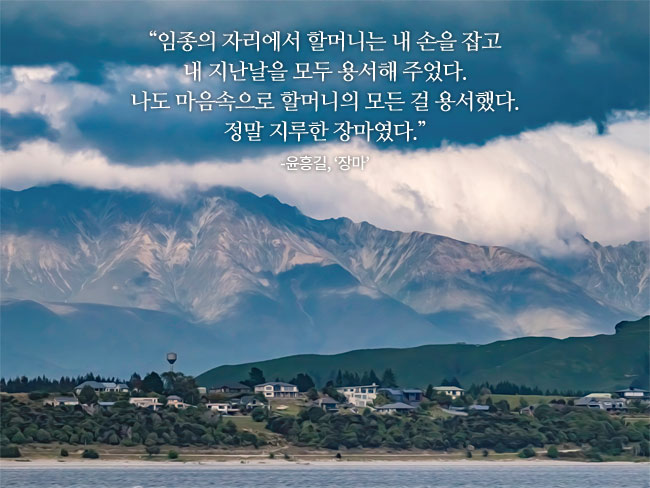
긴 장마가 끝났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가을밤이 깊어졌다. 언제 그런 지루한 장마가 왔었느냐는 듯 순식간에 계절이 바뀌었다. 지난주에는 꽃집 앞을 지나다 코스모스를 봤다. ‘가을이구나.’ 떼 지어 날아가는 잠자리도 봤다. ‘가을이 왔네.’ 길었던 장마가 지나간 자리엔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심상한 가을 풍경이 성실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끝에는 시작이 있고 시작엔 끝이 있다. 마치 계절이 변할 때처럼. 계절감이란 끝과 시작이 맞물릴 때 우리의 기분일지도 모르겠다.
긴 장마를 집에서 보내는 동안 ‘불멍’을 많이 했다. 장작불을 보며 멍 때리는 행위를 불멍이라고 하는데, 타닥타닥 타들어 가는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불길을 보고 있으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뇌를 쉬게 할 수 있어서 인기라고 들었다. 힐링을 찾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유희의 일종인데, 나도 종종 불멍을 때린다. 지난여름 내내 바깥에 비가 오면 안에서는 장작불을 태웠다. ‘비가 내려도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며 괜히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다. 사실 나는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불면을 앓는 것도 아니면서 각종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자율 감각 쾌락 반응(ASMR)’을 틀어 놓고 잔다. 비 오는 소리라든지 깨를 짓이기는 소리 같은 거. 이런 소리에 의지하지 않아도 잠드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왠지 이런 소리가 있으면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것 같다. 마음은 언제나 기댈 것을 찾는다.
고통을 받아들이며 꺼져 가는 불꽃
불을 떠올리면 윤흥길의 소설 ‘장마’가 생각난다. 비가 아니라 불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소설이다. 마지막 장면 때문이다. 앞선 힐링과 어울리는 불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역시나 고통과 상실이 모두 사위는 평안한 불이라는 점에서는 ‘힐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싶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할머니가 임종을 맞는 순간이다. 할머니의 생명이 소멸하는 시간을 묘사하며 저자는 “촛불이 스러지듯 눈을 감았다”라고 표현한다. 측은하고 허전한 모습, 분노에 차고 고통스러워한 모습, 그러나 그 모든 힘들었던 순간들을 인생의 무늬로 받아들이며 서서히 꺼져 가는 불꽃.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라져 가는 생명은 슬프도록 아름답다.
제목처럼 이 소설은 지루하고도 지루한 장마라는 시간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소년 동만의 집에 외할머니가 피난 온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군 소위로 전쟁터에 나간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는 충격에 빠져 빨치산에 저주를 퍼붓는데, 외할머니의 이러한 분노와 저주가 빨치산이 돼 소식이 끊긴 아들을 둔 친할머니의 심기를 거스른다. 두 할머니가 서로 대립하는 동안 세상은 “주룩주룩 쏟아지는 비가 온 세상을 물걸레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는” 장마를 지난다. 이 장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한편 친할머니는 빨치산이 된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에 따라 아들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그날’은 오지 않는다. 그 대신 구렁이가 한 마리 나타나는데, 이를 죽은 아들이라 생각한 할머니는 정신을 잃는다. 그때 외할머니가 나서서 구렁이를 달래 보내고, 정신이 들어 이 일을 알게 된 친할머니는 외할머니에 대한 증오와 미움의 마음을 거둔 뒤에 세상을 떠난다. 할머니의 죽음과 함께 긴 장마도 끝이 난다.
우리 모두 쉽지 않은 여름을 보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지루한 장마 같은 시간이 있을 테다. 그럴 때 절망 뒤에 올 무서운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비극과 화해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날이 어두워지면서부터는 입장들이 뒤바뀌어 위로하는 사람과 위로받는 사람을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암흑 속에서 위로받는 사람과 위로하는 사람은 구분되지 않는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아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견디다 보면 어느 틈엔가 장마는 그치고 가을바람이 불고 있을 것이다. 어느새 바람이 차다.
▒ 박혜진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론 당선,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젊은평론가상
한국 리얼리즘 문학 대표 윤흥길
1942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196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회색 면류관의 계절’이 당선되며 데뷔했다. 1973년에 발표한 중편소설 ‘장마’를 통해 문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장마’는 좌우 이념 갈등이 토착적인 무속신앙을 통해 극복되는 과정을 소년의 눈으로 그려, 분단이 만든 비극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1970년대 후반에는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직선과 곡선’ ‘창백한 중년’ 등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계급의 소외와 갈등 문제가 드러나는 작품을 발표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작가는 급격한 산업화가 가져온 사회적 모순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포착한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완장’ 같은 장편소설을 통해 권력의 생태에 대한 비판의식을 풍자와 해학의 기법으로 표현했다.
윤흥길 작가는 힘 있는 문체로 왜곡된 역사와 부조리한 사회, 그 안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인간에 대해 그리며, 한국 리얼리즘 문학을 대표한다.
한국문학작가상, 현대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21세기문학상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