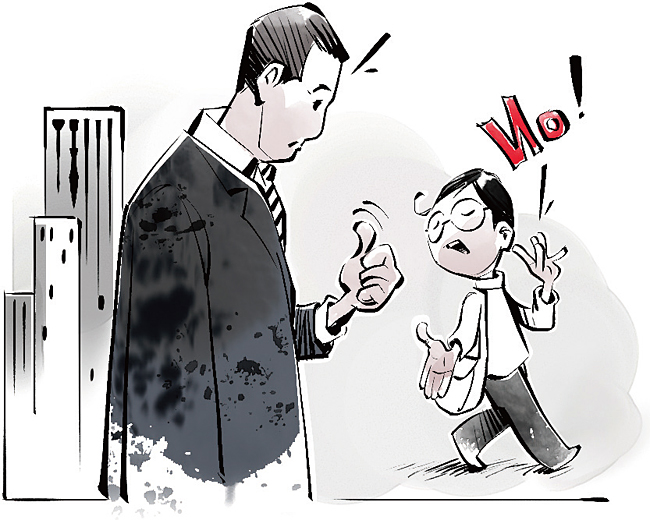
1990년대 말 큰 골칫거리였던 폭주족 사이에선 ‘사이고마데(さいごまで·최후까지)’라는 일본어 한 구절이 유행했다. 그걸 써넣은 머리띠를 하거나, 매직 등으로 오토바이에 쓰기도 했다. 문신으로 새기는 경우도 있었다. 최후까지 버티는 ‘근성(根性)’을 보이겠다는 뜻인데, 일본 야쿠자 조직이나 폭력 서클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교통 법규 어기고, 심야 도심에 불안감 조성하면서 몰려다니는 일에 근성을 보이겠다고 다짐하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일본인들은 ‘근성을 보였다’는 표현을 대단한 칭찬으로 쓴다. 올해 여름 100회를 맞은 일본 고시엔(甲子園·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을 무명의 시골 고교인 가나아시농고의 3학년 투수 요시다 코세이가 뜨겁게 달궜다. 그는 예선 5경기, 본선 5경기를 모두 완투하고 결승전에 등판했다. 우승은 놓쳤지만, 이 기적 같은 일에 일본이 떠들썩했다. ‘어린 선수를 혹사시켰다’는 지적은 ‘근성을 보였다’는 격찬에 묻혔다.
지난달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열린 전(全) 일본 여자실업 역전 마라톤 예선 대회에서 19세 이이다 레이 선수가 구간 종점을 300m 남기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 골절상을 입었다. 걸을 수 없게 되자 두 손과 무릎으로 아스팔트를 기었다. 양 무릎이 터져 피가 흘렀다. 고통을 참기 위해 일그러진 얼굴이 TV로 중계됐다. 전치 3개월의 상처를 입었다. 기권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그녀의 근성에 경의를 표한다’는 사람도 많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근성을 보여준 선수들이 적지 않다. 마라톤의 황영조·이봉주·임춘애, 홍수환 선수 등의 이름을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 ‘근성 싸움’이라면 우리가 일본에 뒤지는 민족이 아니다. 여자 복싱 세계 8대 기구 통합 챔피언 김주희 선수는 가난과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근성의 복서답게 자서전에서 “권투는 주저앉고 싶을 때 한 발짝만 더 나가고, 한 번만 더 손을 뻗으면 이긴다. 아마 삶도 그럴 것이다”라고 썼다. 2010년 챔피언 벨트 4개를 걸고 필리핀 선수와 맞붙어 극적으로 승리한 뒤에는 “시야는 흐릿했지만 그 순간의 세상은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상처투성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의 나는 분명히 웃고 있었다”고 했다.
근성 보여주지 못하는 한국 청년들
일본 경제가 세계를 주름 잡던 1980년대 일본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미국의 한 경제 분석가는 “그들은 모두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 조립 라인에 투입되기 전에 모여서 비장한 표정으로 결의를 다졌다. 그들에게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전투인 모양이다”라고 했다. 우리도 그랬다. 우리는 더 어렵고, 절박했다. 악착같은 민족이라 가진 것 없지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자리까지 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젊은이들이 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힐링’부터 찾는다고 한다. 올 들어 고용 감소로 참사(慘事)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지만,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중소기업에서 일하겠다는 청년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 취업 사이트에 따르면, 직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력 부족이 심한 분야로는 영업직과 생산관리직을 꼽았다. 힘든 일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농어촌과 건설업 등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지경까지 왔다고 한다.
경기 후퇴의 조짐이 보인다. 청년 실업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정부는 세금 퍼부어 단기 알바 만드는 것 말고는 일자리 늘릴 능력이 없어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인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창업, 해외 진출 등에서 길을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쓰러지지 않겠다는 근성을 보여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김주희 선수의 자서전 제목은 이렇다.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