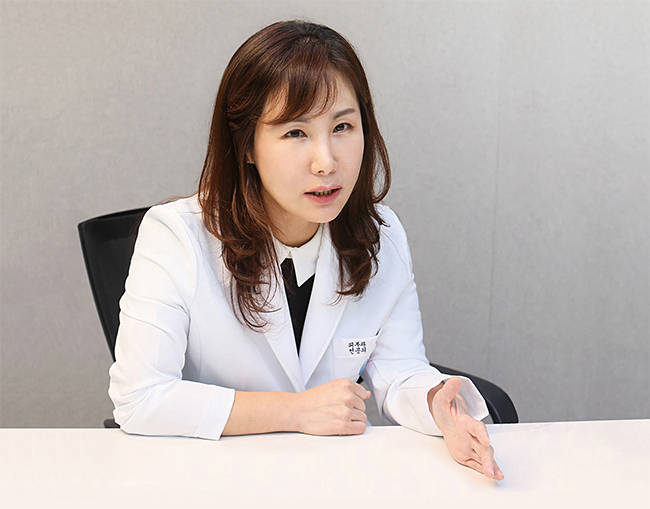
안지영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교수는 지난 2018년 두 명의 아토피 환자를 만났다. 한 명은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아토피가 퍼진 중환자였고, 다른 한 명은 손등 일부분에만 아토피가 발생한 경증 환자였다. 안 교수는 경증 환자에겐 아토피 초기 환자들이 쓰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중환자에겐 심한 아토피 치료를 위한 주사제, 혹은 먹는 약을 처방하려 했다.
그런데 진료가 끝나고 안 교수는 처음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약을 처방했다. 경증 환자용 약인 스테로이드 연고를 중환자에게, 중환자들 치료에 주로 쓰는 주사제를 경증 환자에게 처방한 것이다.
이유는 ‘삶의 질’ 차이였다. 의사가 진단을 통해 아토피 심각도를 계산하는 객관적 지표 ‘EASI(습진중증도) 점수’는 중환자 쪽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환자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 ‘DLQI 점수’는 중환자보다 경증 환자가 더 나쁘게 나왔다. 경증 환자가 가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중환자보다 크게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다.
경증 환자는 아토피 치료용 주사제인 ‘듀피젠트(성분명 듀필루맙)’를 처방해달라 요구했다. 듀피젠트는 아토피 발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세포 간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인데, 주로 중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이다. 당시 듀피젠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주사 1회당 약 100만원을 내고 써야 했다.
안 교수는 처음엔 거부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중환자들이 주로 쓰는 비싼 약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환자는 “가려움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다”라며 듀피젠트를 고집했다. 결국 환자는 1000만원가량을 써서 주사를 10번 맞았다.
반대로 경증 환자에게 쓰려고 했던 스테로이드 연고는 중환자가 처방받았다. 가려움이 적고 일상생활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어, 비싼 중환자용 약을 쓰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눈에 보이는 증상과 정반대로 약을 처방한 건 생애 처음이었지만, 환자들이 100% 만족하는 걸 보며 많은 걸 느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 일을 계기로 객관적 지표인 EASI 점수와 의사의 일방적 판단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아토피 치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2018년 미국으로 건너가 오리건 보건과학대학(OHSU) 에릭 심프슨 교수에게 연수받기 시작했다. 그는 환자와 의사가 대화를 통해 진료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공동 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분야의 대가이자 피부과 명의이기도 하다.
2020년 귀국한 안 교수는 연구를 통해 아토피 심각도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중, 주관적 지표가 환자 삶의 질을 더욱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건 전 세계적으로 안 교수가 처음이었다. 2021년에는 해당 내용이 담긴 논문이 면역학 분야 최고 저널인 ‘JACI(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에 등재되며 그 업적을 인정받았다. 논문 인용지수는 10점대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토피는 몸속 면역체계가 밖에서 들어온 세균과 정상 세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상 세포를 공격하며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환자 10명 중 7명은 유전적 요인으로 병에 걸리며, 이외에 비위생적 주거시설, 식품첨가물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병한다.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토피 환자 수는 96만 명이다.
안 교수는 아토피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권위적인 태도를 내려놔야 한다고 말한다. 객관적 지표와 임상 경험만 갖고 일방적인 진료와 처방을 하면, 환자가 도중에 치료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 교수를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안 교수 이름이 아토피 환자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많이 보인다.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보는지.
“환자들 말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 노력하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초진을 볼 때 매우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애를 쓴다. 증상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그 증상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같은 주관적인 이야기들도 열심히 듣는다. 아토피 치료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의사와 환자가 신뢰 관계를 두텁게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
환자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 계기가 있나.
“2018년 일이다. 아토피가 온몸을 뒤덮은 중증 환자와 손등에만 조금 발생한 경증 환자를 비슷한 시기에 치료한 적이 있다. 초진때 의사 판단으로 아토피 심각도를 측정하는 EASI 점수라는 게 있다. 당연히 중증 환자 쪽이 훨씬 높게 나왔다. 때문에 각자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하려 했다. 중증 환자에겐 심한 아토피를 치료할 때 쓰는 주사제나 먹는 약, 경증 환자에게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주로 쓴다. 그런데 정작 중증 환자가 스테로이드 연고, 경증 환자가 주사제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
이유가 뭐였나.
“환자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 차이 때문이었다. 경증 환자는 아토피가 생긴 부분은 작지만 간지러움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환자였다.
반면 중증 환자는 전신에 아토피가 있었지만 간지러움도 적고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없다고 했다. 원래 나도 EASI 점수 같은 객관적 지표와 내 임상 경험을 중심으로 모든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환자들과 실랑이까지 벌였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약을 처방해줬다.”
이후 그 환자들은 어떻게 됐나.
“치료 기간 내내 엄청나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제공하는 게 의사가 할 일 아닌가 싶었다. 그런 와중에 미국 오리건주 보건과학대학에 연수를 가서 에릭 심프슨 피부과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2019년까지 미국에서 공부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뒤부터 조금씩 진료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 건가.
“그렇다. 그와 동시에 연구도 진행했다. 아토피 심각도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중 어느 쪽이 환자 삶의 질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 결과 주관적 지표가 실질적인 환자 삶의 질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보고 만지면서 진단한 것보다 환자 본인이 증상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해외 연구자들도 비슷한 주제로 연구 논문을 내기 시작했다. 의사이자 임상가로서 뿌듯한 순간이었다.”
진료 방식을 바꾸면서 환자들 반응이나 예후도 더 좋아졌나.
“물론이다. 가장 큰 변화는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에 발길을 끊는 환자들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점이다. 환자들이 이전보다 진료를 잘 따라오게 됐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서로 대화를 트면서 환자들이 의사가 자기 병과 그로 인해 힘든 마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특히 아토피는 치료가 오래 걸리는 만큼 고통을 참아야 하는 기간도 길다. 그런 와중에 의사와 소통도 안 되고, 약이라고 주는데 빨리 낫지도 않고 하다 보면 의사가 내 병을 잘 아는 게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 그렇게 불신이 싹텄을 때 결국 치료를 포기하는 거다.”
임상에 있는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자세를 낮출 필요도 있다고 보는가.
“당연하다. 현재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어서 가끔 강연을 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환자가 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결국 의사들이 권위적 자세를 내려놓고 환자와 소통하며 함께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아토피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한 병들은 모두 그렇다고 생각한다.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붙잡고 같이 가야 한다.”